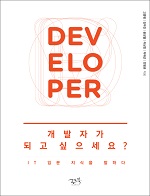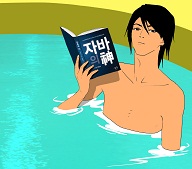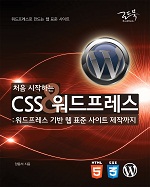편집자노트
2011. 7. 1. 11:39
디자인 전공이 아닌 나에게 편집자로서 항상 아킬레스건은 디자인이다.
참고로 난 경제학 전공이다. 대학 때는 F를 수도 없이 달고 다니긴 했지만 일반인보다 조금 더 깊게 수요공급 곡선에 대해 안다는 정도로 위안을 삼는다.
그렇다고 관련 서적을 탐구하면서 배우자니 이미 뼛속까지 유전자처럼 박혀있는 나의 디자인감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아 지레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몇가지 기준을 갖고 내가 답을 내는 형식으로 색을 결정하곤 한다.
1) 색으로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 하는가?
2) 독자에게 불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요소는 없는가?
3) 본판(텍스트)을 흐리게 하지는 않은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디자인을 설계할 때 디자이너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고 기획 의도와 목적, 독자의 성향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위의 기준에 대한 답이라는 것도 사실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성의있는 형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천하다보면 어떤 통계가 보인다. 그 통계에 따라 객관성을 조금씩 부여하면서 영점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의 아마추어적인 방식이다.
기준 1)번은 "웅장하다" "따듯하다" "시원하다" "화려하다" "소박하다" 등의 형용사적 느낌을 주로 활용하지만 우리말 어휘가 딸린 나로서도 참 힘든 영역이다. 그래서 만날 비슷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2)번과 3)번의 기준은 디자인적인 완성도 또는 아름다움과 항상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적인 아름다움만 생각하다보면 화장만 그럴싸 하게 해서 본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화장미인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본래 컨텐츠를 더 빛나게 해야 하는 데 말이다. 그런데도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자꾸 고집하게 된다. 남자가 예쁘게 화장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디자인은 책이 나올 때까지 컨텐츠와 충분히 교감한 편집자가 그 느낌을 갖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남의 의견에 따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선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난 이리갔다 저리갔다 했다.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참고로 난 경제학 전공이다. 대학 때는 F를 수도 없이 달고 다니긴 했지만 일반인보다 조금 더 깊게 수요공급 곡선에 대해 안다는 정도로 위안을 삼는다.
그렇다고 관련 서적을 탐구하면서 배우자니 이미 뼛속까지 유전자처럼 박혀있는 나의 디자인감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아 지레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몇가지 기준을 갖고 내가 답을 내는 형식으로 색을 결정하곤 한다.
1) 색으로서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 하는가?
2) 독자에게 불편하게 느끼도록 하는 요소는 없는가?
3) 본판(텍스트)을 흐리게 하지는 않은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디자인을 설계할 때 디자이너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고 기획 의도와 목적, 독자의 성향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위의 기준에 대한 답이라는 것도 사실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성의있는 형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천하다보면 어떤 통계가 보인다. 그 통계에 따라 객관성을 조금씩 부여하면서 영점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의 아마추어적인 방식이다.
기준 1)번은 "웅장하다" "따듯하다" "시원하다" "화려하다" "소박하다" 등의 형용사적 느낌을 주로 활용하지만 우리말 어휘가 딸린 나로서도 참 힘든 영역이다. 그래서 만날 비슷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2)번과 3)번의 기준은 디자인적인 완성도 또는 아름다움과 항상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적인 아름다움만 생각하다보면 화장만 그럴싸 하게 해서 본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화장미인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본래 컨텐츠를 더 빛나게 해야 하는 데 말이다. 그런데도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자꾸 고집하게 된다. 남자가 예쁘게 화장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디자인은 책이 나올 때까지 컨텐츠와 충분히 교감한 편집자가 그 느낌을 갖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남의 의견에 따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선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난 이리갔다 저리갔다 했다.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편집자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정의 원칙 (0) | 2011.08.03 |
|---|---|
| 책의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편집자 (0) | 2011.07.07 |
| 훨씬 똑똑해지고 좋아진 맞춤법 검사기 (0) | 2011.06.20 |
| 독자서평의 추억 (0) | 2011.05.27 |
| 편집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5) | 201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