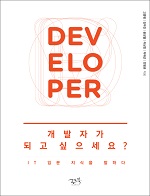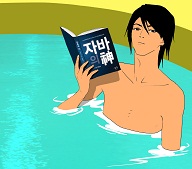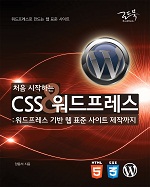편집자노트
2011. 5. 27. 20:25
편집자가 책을 세상에 내보내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첫 독자평이 올라오는 때이다. 온라인 서점이 발달되다보니 독자 반응은 가히 실시간이다. 그리고 직설적이다. 네거티브한 내용이든 포저티브한 내용이든 대부분 직설적이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중간정도의 애매한 서평을 남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
포저티브이든 네거티브이든 분명 이유가 있다. 이유없는 독자 클레임은 없다.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이든 책이든 똑같은 소비재다. 쓰다가 열받으면 AS를 신청하든지 어디다가 분풀이라도 해야 하는 게 독자의 마음이고 소비자의 마음이다.
그걸 알면서도 편집자도 사람인지라 서슬 퍼런 서평에 시퍼렇게 멍이 든다. 이때 편집자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 그들의 성장맵이 달리 그려진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운이 없었다." "뭐~ 그정도의 서평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면 편집자로서 성장은 아득하다. 출판사의 성장도 요원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해내고 그것을 다음 책에 하나하나씩 반영할 때 비로소 편집자는 쭉쭉 뻗어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다만 독자의 절박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나가고 독자와 조금씩 교감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편집자의 덕목 중 중요한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하다.
독자 클레임은 베테랑 시니어 편집자도 피해갈 수 없다. 책이라는 게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제픔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일부는 비판적 읽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런 클레임을 애써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만심이다. 매너리즘이다. 본래 의도의 사가지대에 있는 독자의 클레임도 이유없다 기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시점이다.
사각지대를 좀더 쉽게 표현하면, 컨텐츠가 타깃하고 있지 않은 독자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수준 높다는 것과 어렵다"는 분명 다른 말이다. 초보자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초보자가 중급 이상 타깃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도 '저자의 내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장은 그 책을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이때는 자신을 탓하지 책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 무플보다는 악플이 나을 때도 있다. 서평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을 두는 독자가 없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다. 이때의 악플은 분명 익명의 인터넷 악성 댓글과는 분명 다르다. 상처받아야 할 게 아니라 약으로 써야 할 소중한 재료다.
가끔 예전에 내가 냈던 책들의 서평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끄럽기도 하다. 그때의 두근거림, 가슴쓰라림, 벅찬 감동, 그런 것들이 다시 가슴속에서 일렁인다. 인터넷 서점은 절판하더라도 책 정보는 남긴다. 서평도 고스란히 남긴다. 10년 전의 책이라도. 가끔 독자 서평의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면 서 출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다독인다.
"책 값이 아깝지 않았다."
독자에게 들었던 최고의 서평이었다.
포저티브이든 네거티브이든 분명 이유가 있다. 이유없는 독자 클레임은 없다.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이든 책이든 똑같은 소비재다. 쓰다가 열받으면 AS를 신청하든지 어디다가 분풀이라도 해야 하는 게 독자의 마음이고 소비자의 마음이다.
그걸 알면서도 편집자도 사람인지라 서슬 퍼런 서평에 시퍼렇게 멍이 든다. 이때 편집자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 그들의 성장맵이 달리 그려진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운이 없었다." "뭐~ 그정도의 서평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면 편집자로서 성장은 아득하다. 출판사의 성장도 요원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해내고 그것을 다음 책에 하나하나씩 반영할 때 비로소 편집자는 쭉쭉 뻗어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다만 독자의 절박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나가고 독자와 조금씩 교감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편집자의 덕목 중 중요한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하다.
독자 클레임은 베테랑 시니어 편집자도 피해갈 수 없다. 책이라는 게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제픔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일부는 비판적 읽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런 클레임을 애써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만심이다. 매너리즘이다. 본래 의도의 사가지대에 있는 독자의 클레임도 이유없다 기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시점이다.
사각지대를 좀더 쉽게 표현하면, 컨텐츠가 타깃하고 있지 않은 독자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수준 높다는 것과 어렵다"는 분명 다른 말이다. 초보자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초보자가 중급 이상 타깃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도 '저자의 내공'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장은 그 책을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이때는 자신을 탓하지 책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 무플보다는 악플이 나을 때도 있다. 서평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을 두는 독자가 없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다. 이때의 악플은 분명 익명의 인터넷 악성 댓글과는 분명 다르다. 상처받아야 할 게 아니라 약으로 써야 할 소중한 재료다.
가끔 예전에 내가 냈던 책들의 서평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끄럽기도 하다. 그때의 두근거림, 가슴쓰라림, 벅찬 감동, 그런 것들이 다시 가슴속에서 일렁인다. 인터넷 서점은 절판하더라도 책 정보는 남긴다. 서평도 고스란히 남긴다. 10년 전의 책이라도. 가끔 독자 서평의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면 서 출판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다독인다.
"책 값이 아깝지 않았다."
독자에게 들었던 최고의 서평이었다.
'편집자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색의 미학 (0) | 2011.07.01 |
|---|---|
| 훨씬 똑똑해지고 좋아진 맞춤법 검사기 (0) | 2011.06.20 |
| 편집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5) | 2011.05.27 |
| 기획은 필(feel)이다? (0) | 2011.04.30 |
| 비슷한 주제의 경쟁서가 먼저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 (0) | 2011.04.29 |